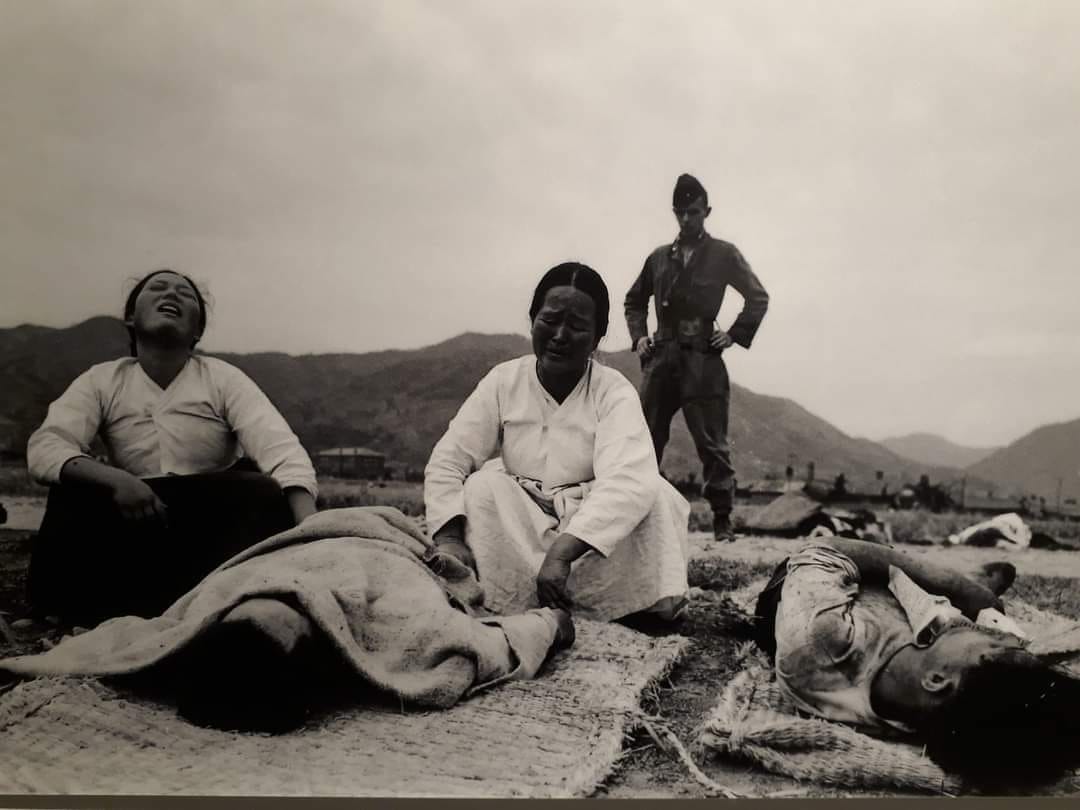1. 사례
(1) 전 배우자 자녀 있는 경우
A 씨(60대)와 35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 B 씨(70대)는 최근 사망했다. B 씨가 남긴 재산은 A 씨와 함께 살고 있던 B 씨 명의의 서울의 아파트 1채였다. 그런데 B 씨의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두 명이 A 씨에게 연락해 자신들도 아파트 1채 중 지분이 있다며 법률상 상속분에 따라 나눠 달라고 주장했다. B 씨 전처의 자녀들은 지난 35년 간 B 씨와 왕래도 없던 사이였다. B 씨가 사망할 때 별도로 남긴 유언도 없어서 A 씨는 B 씨 전처의 자녀들과 B 씨와 낳은 자신의 자녀까지 모두 상속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2)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얼마 전 아내를 떠나보낸 C 씨(70대)는 서둘러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신이 일하며 번 돈으로 서울의 건물 한 채를 아내의 명의로 매매했는데, 아내가 사망하면서 이를 자녀들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셋째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며느리, 손자들과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어느 정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복잡해 졌다. 대습상속인까지 상속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됐다.
상속 관련 다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정 상속분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배우자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5년째 그대로인 배우자 몫 법정상속분 1.5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뜻한다. 사례 2에서는 상속인인 셋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셋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2. 상속 분쟁 증가추세 [=상속사건 10년 전 보다 61% 늘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 사건은 5만7567건으로 2022년(5만1626건) 대비 5941건 늘어났다. 2013년 3만5030건이었던 상속사건은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61%가량 크게 뛴 것이다.
가사 비송사건 가운데 상속에 관한 사건은 기여분에 관한 사건을 비롯해 상속재산분할,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 수리),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이 있다.
3. 현행 민법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민법 제1012조).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상속인들은 일률적으로 상속분을 받는다(민법 제1009조). <그래픽 참조> 이때 고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던 고인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남겼을 때 배우자, 자녀 1, 자녀 2가 1.5:1: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돼 각각 8억 5800만 원, 5억 7100만 원, 5억 7100만 원가량을 상속받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1990년 1월 개정된 이후 35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는 것. 모든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1.5’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비율보다 재산 형성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는 법원에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제 몫을 다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호식(6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배우자 상속분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라진 세상에 맞는 상속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일률적인 배우자 상속분 1.5가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한 세분화 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 배우자 기여분 확대 필요
법조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김진미(44·43기)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고인의 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여가 상당한 경우에도 1.5로 제한돼 있어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인들 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배우자 기여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주요 로펌의 가사팀 변호사도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고인 재산의 절반을 주는 곳이 많다”며 “배우자 기여분 5할 가산은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유언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사소년법관을 지낸 이은정(52·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고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축적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산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기여분 청구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 관련 법 연구회 발족
법원에서도 변화한 사회상과 가족관을 담은 가족제도 관련 법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24년 7월 ‘가족법연구회 커뮤니티(회장 김시철 사법연수원장)’가 개설됐다. 전통적인 가족 관념이 흔들리며 가사 사건이 해마다 늘고 관련 법률시장도 커지면서 현행 가족법과 판례가 변화한 사회상과 가족관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출처-
2025. 3. 5. 법률신문

[요약]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도록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