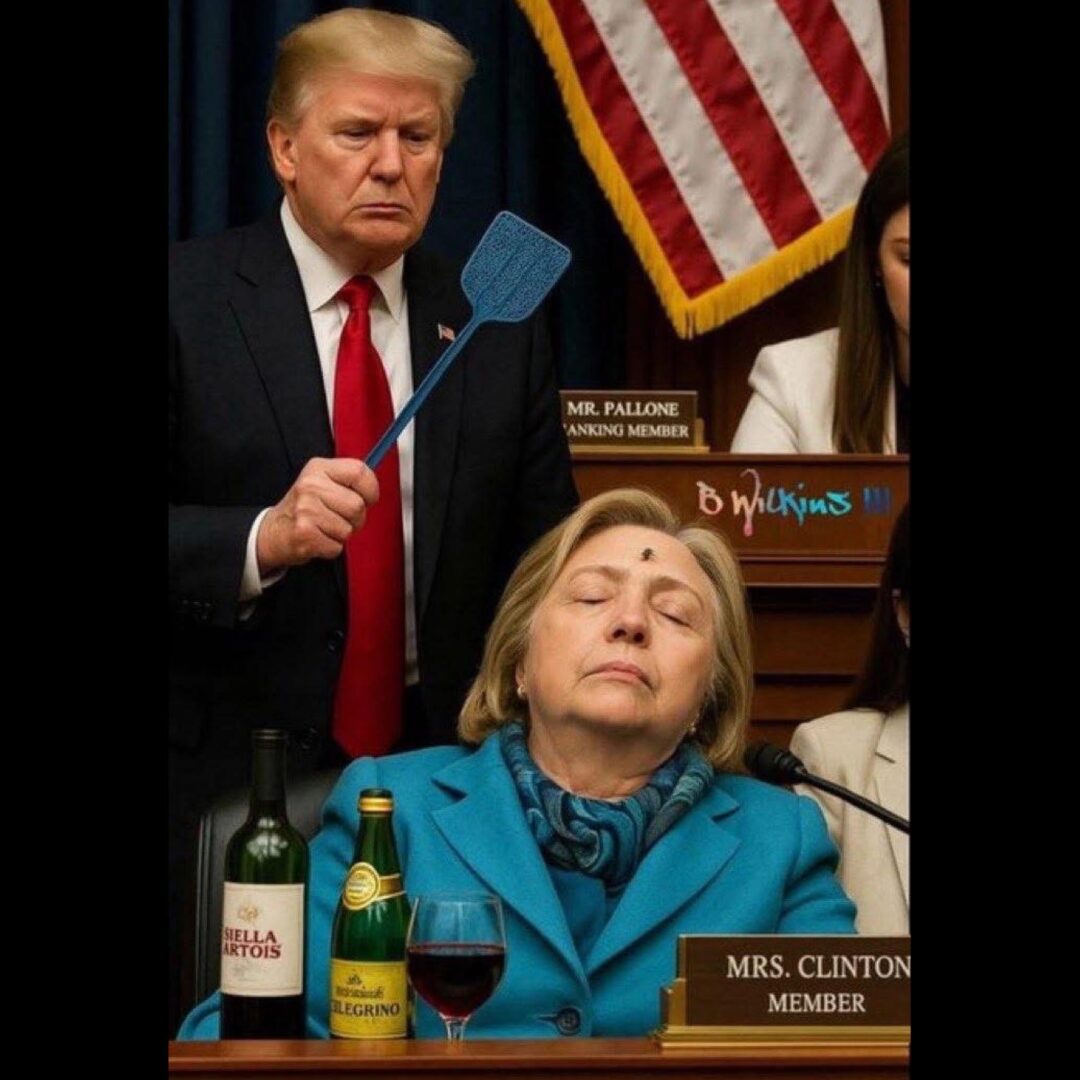1. 프리넙 필요성 강조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앞두고 매번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혼전계약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나는 혼전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전계약 덕분에 이혼이 훨씬 수월했고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발간한 저서 《귀환의 기술(The Art of the Comeback)》에서 프리넙에 서명을 거부하는 ‘좋은 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자는 (그 여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 미국·영국, 판례로 폭넓게 인정
(1) 미국
해외에서는 프리넙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 주에서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한다. 미국은 과거 부부 재산 약정이 이혼을 조장하고 혼인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70년 플로리다주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부부 재산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프리넙이 부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보호와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2) 영국
영국도 2010년 대법원의 첫 판단을 계기로 프리넙을 통한 부부 재산 계약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변했다. 당시 영국 대법원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혼전 계약에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혼전 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캐나다
캐나다는 주마다 가족법이 다르지만 대개 혼전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이 공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
3. 성문법 인정국가, 호주·일본
(1) 호주
호주에서도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라 혼전합의서(Binding Financial Agreements·BFA)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BFA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이어야 한다. 강요나 협박 등 부당한 영향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하고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완전한 공개도 필요하다. 자산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법원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호주 로펌 MH파트너스의 한명철 호주변호사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나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BFA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호주에서 BFA를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2) 일본
일본은 민법에 따라 ‘부부 재산 계약’을 맺고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재산 귀속, 관리 방식,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 혼인을 앞둔 이들이 혼인 신고 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등 제3자에 대한 계약 내용은 주장할 수 없다.
혼인 후에는 부부 재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 가능하다. 법무법인 가온 일본팀장을 맡고 있는 최현윤(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으로 특유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경우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다만 부부 재산 계약으로는 상속 분배를 정할 수 없으며 법정상속분(유류분) 포기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는 부부 재산 계약으로 사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 독일
독일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혼전계약서를 인정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7년 상속권 및 유류분 권리를 상호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된 혼전계약서에 대해 “한쪽 배우자에게 객관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 정비·태도 변화 필요
한국에서는 프리넙이 아직은 외국처럼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일부 실무가들은 프리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성우(5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최근에는 각자 재산을 개개인의 것으로 하고 생활비는 통장에 모아 생활하는 부부도 많은 만큼 추후 분쟁이나 재산 분할이 있을 경우 프리넙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나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사부 재판장을 지낸 한 법관은 “아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범위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실무가 확립돼 있지 않다”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처럼 프리넙 역시 관련 사례가 쌓이면 그 범위와 효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51·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프리넙이 실제 이혼 소송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며 “이혼할 때 프리넙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 재산 계약의 실효성은 이혼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혼할 때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 재산 계약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형해화된다”고 말했다.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전안나(51·34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한국 민법도 부부 재산 약정 규정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량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혼전계약이 일반화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됐다”며
“프리넙이 도입되면 자칫 재산이 현저히 적은 한쪽 당사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통해 이혼할 때 재산을 전혀 못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포스트넙
(1) 정의
‘혼후계약(postnuptial agreement·줄여서 ‘포스트넙’)’이라는 것도 있다. 프리넙과 달리 결혼 후에 작성된다는 게 특징이다. 포스트넙은 프리넙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를 대비해 자산 및 재정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하는 계약이다.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기타 재정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분쟁을 대비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주로 작성된다.
(2) 미국
미국에서는 포스트넙에 따라 프리넙의 조항도 혼인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프리넙보다 포스트넙의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당사자들이 이미 결혼 생활 동안 함께한 시간과 기여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조율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도 공증을 받은 혼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캐나다 역시 혼후계약을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주마다 다른 가족법을 따라야 한다.